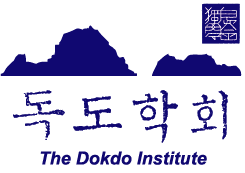[제 41 문] 그렇다면, 1693∼1695년간의 '울릉도=죽도' 영유권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논쟁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답]
▶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잘 해결되었다.
▶ 일본측에서는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던 대마도 도주 종의륜(宗義倫)이 1695년에 죽고 그의 아우 종의진(宗義眞)이 도주가 되었다.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1693년에 안용복을 송환시킬 때 후대하면서 죽도(울릉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했었다. 막부는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대마번의 번주 宗義倫(종의륜)이 안용복을 송환하면서 죽도(울릉도) 획득의 공격외교를 행하는 것을 무리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선측의 울릉도(죽도) 수호의지가 매우 강경하다는 것을 듣고 종의륜(대마도 도주)의 무리한 공격외교가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우호를 불필요하게 해치지 않는가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다.
▶ 이 때 마침 종의륜이 죽도 그의 아우 종의진이 도주가 되자, 종의진은 1696년 1월 28일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 장군에게 새해 인사 겸 새 도주 취임보고를 하러 에도에 올라가게 되었다. 막부 장군은 백기주(伯耆州) 태수 등 4명의 태수들이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울릉도(죽도) 문제에 대하여 대마도 신주 종의진에게 조목조목 날카로운 질문을 하였다. 종의진은 죽도(竹島)가 조선의 '울릉도'이고 그것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 막부 장군은 대마도 신주 종의진과의 질의·응답을 종합하여 참조한 후, 다음과 같은 명령하였다. 그 요지는 ①죽도(울릉도)는 일본 백기(伯耆)로부터의 거리가 약 160리이고 조선으로부터의 거리는 약 40리 정도로서 조선에 가까워 조선영토로 보아야 하며, ②앞으로는 그 섬에 일본인들의 도해(渡海: 국경을 넘어 바다를 건너는 것)를 금지하며, ③이 뜻을 대마도 태수가 조선측에 전하도록 하고, ④대마도 태수는 돌아가면 형부대보(刑部大輔: 대마도의 재판 담당관)를 조선에 파견하여 이 결정을 알리고 그 결과를 막부 장군(관백)에게 보고하도록 명령한 것이었다.
▶ 일본측 자료인 {朝鮮通交大紀(조선통교대기)}(8)는 당시 막부 관백(집정 阿部豊後守)의 결정과 명령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다음해 병자년(1696년) 정월에 豊後守(풍후수)는 유시(諭示)하기를 "죽도(竹島: 울릉도)가 因幡州(인번주)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아직 우리나라(일본…인용자) 사람들이 거주한 적이 없고, 台德君(태덕군: 德川秀忠) 때에 米子(미자) 마을의 어민이 그 섬에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다. 지금 그 땅의 지리를 헤아려 보건대 因幡州(인번주)와의 거리는 약 160리이고 조선과의 거리는 약 40리이어서, 일찍이 그 나라(조선…인용자) 땅이라는 것은 의심할수 없을 것 같다. 우리 국가에서 병력으로써 임한다면 무엇을 요구하여 얻지 못하겠는가? 다만 쓸모없는 조그마한 섬을 가지고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섬(죽도: 울릉도…인용자)을 저 나라(조선…인용자)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니 지금 또 돌려준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일본…인용자) 사람들이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뿐이다. 지금 조정의 의논도 이전과 같지 않으니, 서로 다투어 마지않는 것보다는 각각 무사한 것이 낫다. 마땅히 이 뜻으로서 저나라에 의논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위의 일본측 자료를 보면,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백은 ①대마도 전도주의 주장과 같이 竹島(죽도:울릉도)가 因幡州에 속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일본 사람들이 그 섬에 거주한 적이 없고, 德川秀忠(덕천수충) 때 米子의 어민(大谷甚吉과 村川市兵衛)에게는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오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며, ②지금 죽도의 지리를 헤아려 보면, 일본(인번주)으로부터는 약 160리 떨어져 있는 반면 조선으로부터는 약 40리 떨어져 있어서 일찍이 조선영토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③만일 일본이 병력으로써 임한다면 얻지 못할 것이 없겠지만 작은 섬 하나를 가지고 우호관계를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며, ④竹島(죽도)를 조선으로부터 빼앗았던 것이 아니니 지금 또 돌려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일본어부들이 국경을 넘어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 하는 것은 금지해야 할 뿐이다. ⑤지금 조정의 의논도 이전과 같지 않아서 서로 분쟁하는 것보다는 무사한 것이 더 나으니, 이 뜻으로서 조선측과 의논하라는 것이었다.
▶ 즉 도쿠가와 막부 장군은 1696년 1월 대마도 신도주 종의진(宗義眞)에게 竹島(죽도)는 조선영토이며 이 섬을 조선으로부터 빼앗은 일은 없었고, 1618년과 1661년에 米子(미자)의 어민(大谷과 村川 2가문)에게 '竹島渡海免許'(죽도도해면허) '松島渡海免許'(송도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은 그 어민들이 죽도와 송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허가한 것 뿐이고, 이 때 그러한 '도해면허'를 허가한 것은 그 섬을 빼앗았던 것이 아니라 고기잡이하러 건너가는 것 만을 허가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섬을 돌려준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단지 일본 어민들이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뿐이라고 명령한 것이었다.
▶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이 명령에 의하여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는 '조선영토'로 일본측에 재확인되었고, 1618년의 '竹島渡海免許'(죽도도해면허)와 1661년의 '松島渡海免許'(송도도해면허)는 자동적으로 취소되었으며, 일본 어민들은 조선영토인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우산도: 송도)에 건너가 고기잡이를 자유로이 할 수 없게 금지되었다.
▶ 1696년 1월의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결정은 3년간 끌어온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에 일단 종결을 찍은 것이었다.
[제 42 문] 그러면 대마도 번주는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위의 결정과 명령을 즉각 수행하여 조선측에 통보했는가?
[답]
▶ 즉각 통보는 하지 않고 천천히 시일을 끌면서 그해 연말까지는 통보하였다. 그 사이에 안용복이 즉각 활동을 재개하여 조선정부는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생각과 결정을 대마도의 공식 사절이 오기 전에 알게 되었다.
[제 43 문] 안용복(安龍福)은 1696년 1월과 12월 사이에 또 어떠한 활동을 했다는 것인가?
[답]
▶ 안용복은 1696년 봄에 조정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제2차로 일본에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조선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울릉도·독도를 수호하려고 하였다.
▶ 이 때 안용복은 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 관백이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 독도가 조선영토이고, 울릉도·독도에의 일본 어민의 고기잡이 도해(渡海)를 금지한 사실을 알고 행동했는지 모르고 행동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안용복은 이전부터 대마도 일본인들과 통교가 있던 인물이고 일본어도 능숙했으므로,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결정을 마악 알고 출발했을 가능성도 높다.
▶ 안용복은 1696년(숙종 22년) 봄에 울산에 가서 울릉도에 가면 해산물이 많다고 하면서 순천 송광사의 장사꾼 중 뇌헌(雷憲), 글을 잘하는 이인성(李仁成), 사공 유일부(劉日夫), 유봉석(劉奉石), 김길성(金吉成), 김순립(金順立) 등 16명을 모아 울릉도에 들어갔다. 과연 울릉도에는 이미 다수의 일본 배들이 건너와 정박해 있으므로, 앞서 쓴 바와 같이 안용복은 [울릉도는 본래 우리 영토인데 어찌 감히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가. 너희들은 모두 묶어 마땅하다]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 이에 일본인들은 [우리들은 본래 松島(송도, 우산도, 독도)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를 나왔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마땅히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거짓말로 모면하려 하였다.
▶ 안용복은 앞서 쓴 바와 같이 다시 [송도(松島)는 곧 우산도(于山島)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의 땅이다. 너희들이 감히 여기에 산다고 하느냐(松島卽子(于)山島 此亦我國也 汝敢往此島)]고 꾸짖고 이들을 울릉도로부터 쫒아내었다.
▶ 안용복 등이 이튿날 새벽 배를 타고 우산도(于山島: 독도)에 들어가 보았더니 일본 어부들이 솥을 걸어 놓고 물고기를 조리고 있었다. 안용복 등이 막대기로 솥 걸어 놓은 것을 부수면서 큰 소리로 꾸짖으니 일본 어부들은 모두 배를 타고 돌아갔다고, {숙종실록}과 {증보문헌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