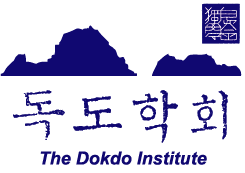[제 61 문] 동남제도개척사 겸 포경사 김옥균은 울릉도·독도 재개척에 성공했는가?
[답]
▶ 김옥균 등 개화당은 '근대국가'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울릉도·죽서도·독도에 일본인들이 들이닥칠 것을 염려하여 재개척 사업에 열정적이었다. 그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정부 주도하에 강원도·경상도·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 지원자를 모집하여 울릉도에 이주시키고 적극 후원하였다. 그 결과 이주민 수가 1883∼1884년에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ㄴ) 정부와 개척사가 일본측에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침입에 강경하게 항의하고 요구하여 울릉도에 들어온 일본인들을 모두 철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1883년 9월 관리와 순경 등 31명을 태운 越後丸이란 배를 울릉도에 파견하여 그동안 울릉도에 불법 침입해서 거주하기 시작한 일본인 254명 모두를 태워 철수시켰다. 그 결과 울릉도에는 한 명의 일본인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개척사 김옥균의 울릉도·독도 재개척사업의 큰 성과였다.
(ㄷ) 개척사 김옥균은 정부의 허락도 없이 미곡을 받고 일본 天壽丸 선장에게 울릉도삼림 벌채에 대한 허가장을 발급한 울릉도 도장 金錫奎를 파면하고 처벌하였다. 김옥균은 울릉도삼림을 국가가 외화를 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하였다.
(ㄹ) 개척사 김옥균은 조선정부가 울릉도삼림을 벌채하여 일본이 수출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개화당 白春培를 1884년 8월 일본에 파견해서 일본 萬里丸 선장과 판매계약을 체약하였다. 김옥균은 울릉도삼림 벌채와 임업·어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울릉도 삼림을 담보로 차관교섭을 하였다.
▶ 1884년 12월 갑신정변에 실패하여 김옥균 등이 일본에 망명하자 개화당의 울릉도·독도 재개척사업은 일단 장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제 62 문] 갑신정변 후에는 울릉도·독도 재개척사업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추진 주체가 없어서 중단되었는가?
[답]
▶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민비수구파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민비정부는 울릉도에 전임(專任) 도장(島長)을 두지 않고, 개항 이전 수토제도 때의 평해(平海)군의 월송포(越松浦)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울릉도를 겸임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정부의 울릉도 재개척 사업은 열의가 식었지만,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남해안 다도해 지방에서 울릉도에 이주하는 백성들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 1894년에 온건개화파들이 집권하자 1894년 12월 울릉도 수토(搜討)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전임 도장을 두었다가, 1895년 8월에는 島長을 島監으로 바꾸어 判任官 직급으로 격상시키고, 초대도감에 裵季周를 임명하였다. 울릉도 재개척 사업은 다시 활기를 띄었다.
▶ {독립신문}에 1897년 3월 현재 울릉도 재개척 사업 통계가 실려 있는데, 조성한 마을이 12개 동리, 호수가 397호, 인구가 1,134명(남자 662명, 여자 472명), 개간한 농경지가 모두 4,775두락이었다.
[제 63 문] 일본인들은 울릉도에서 모두 철수한 후 다시 들어오려는 기도는 없었는가? 일본측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이 무렵의 정책은 어떠했는가?
[답]
▶ 1894∼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95년 후반기부터 일본인들이 다시 울릉도를 불법 침입하여 목재들을 공공연히 도벌하여 일본으로 싣고가는 일이 격증하였다.
[제 64 문] 조선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울릉도의 목재를 일본측에서 탐내었다면 큰 경제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었을 터인데, 조선정부는 왜 이를 벌채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는가?
[답]
▶ 청·일전쟁 후 일본은 1895년 양력 10월 8일 경복궁을 야습하여 민비(명성황후)시해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국왕 고종은 일본의 독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1896년 2월 11일 국왕이 러시아공사관에 옮겨 들어가는 이른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하였다.
▶ 국왕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안에서 신정부를 조직하고 정사를 보자, 러시아측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신정부는 친러수구파 정부로 조직되고, 국왕 고종도 러시아를 비롯한 서강열간의 이권침탈요구를 많이 받게 되었다. 이 때 러시아는 고종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1896년 9월 "두만강·압록강 유역 대안 산림과 울릉도 삼림의 벌채권"을 러시아 회사(대표 J. I. Briner)에게 '이권'(利權)으로 25년간 양여하게 되었다.
▶ 그러므로 울릉도·독도는 조선(대한제국)의 영토였지만, 울릉도의 재목은 1896년부터 25년간 제정 러시아가 '벌채권'을 갖게 된 것이었다.
▶ 따라서 1896년 9월 이후에는 조선정부는 울릉도의 나무를 벌채하여 외국에 수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제 65 문] 자기나라의 삼림자원의 벌채권을 남의 나라에 '이권'으로 주어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다니, 어찌하다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울릉도의 삼림벌채를 놓고 정부는 러시아에게 '벌채권'을 넘겨주고, 일본인들은 불법 침입해서 울릉도 삼림을 벌채해가면, 3국 사이에 국제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는가?
[답]
▶ 발생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주한 러시아 공사가 여러차례 항의문을 보내왔다. 특히 1899년에는 러시아측이 대한제국 정부에게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에 들어와서 삼림을 벌채해 실어가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 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 대한제국 정부는 러시아측의 항의는 물론이오, 무엇보다도 개항장이 아닌 한국영토에 일본인들이 불법 침입하여 함부로 삼림을 벌채해간다는데 놀라서 이를 중지시키고, 울릉도 이주민에 대한 행정관리를 위해 1899년 5월 裵季周를 울릉도 島監으로 재임명하여 파견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러시아측과 일본측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배계주와 함께 부산항 稅務司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세무사를 동행케 해서 울릉도에의 일본인의 침입여부 실태를 관찰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제 66 문] 재부임한 울릉도 도감 裵季周와 부산항 외국인 세무사의 울릉도 실태 보고는 어떠했는가?
[답]
▶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1899년 5∼6월 현재 울릉도에는 일본인 수백명이 떼를 지어 불법침투해서 村落을 만들어 거주하고 있었으며, 선박을 운행하면서 삼림을 연속하여 벌채해서 일본으로 운반해 가고 곡식과 물화를 밀무역하고 있었다. 울릉도 이주 한국인이 조금이라도 이를 말리면 일본인들은 칼을 빼어들고 휘둘러 대면서 멋대로 폭동하여 꺼리끼는 바가 조금도 없으므로, 한국인 이주민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여 안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울릉도 도감 배계주는 울릉도에 불법으로 들어온 일본인들과 그들의 행패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므로 중앙정부의 명령으로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울릉도 이주민 한국인들이 이산하고 말겠기에 급히 보고하니 중앙정부가 적극 조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실태를 알게 된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외부대신이 주한 일본공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울릉도에 불법 밀입도한 일본인들을 기한을 정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개항장이 아닌 항구에서 밀무역한 죄에 대해서는 '조·일수호조규'(1876년)의 약정에 의거해서 조사·징벌하여 후일의 폐단을 영구히 근절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 한편 러시아측은 1899년 9월 15일자로 대한제국 외부대신에게 공문을 보내어 울릉도에 불법으로 들어와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삼림을 벌채해가고 행패를 부리고 있으므로 일본공사관에 요구하여 개항장이 아닌 울릉도에 불법 밀입도한 일본인들을 쇄환해 가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여 대한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제 67 문]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불법입도와 삼림벌채 및 불법행태와 이를 금지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오는 러시아측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답]
▶ 대한제국 정부는 처음에는 주한일본공사관을 통하여 일본인들을 철수시키려고 일본공사에게 공문을 보내었다. 그러나 일본공사의 답장은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었다. 예컨대 만일 일본인들의 범법행위가 있으면 한국관헌이 체포하여 가까운 일본영사에게 넘기도록 '조·일수호조규'에 규정되어 있으니 한국관헌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다.
▶ 대한제국정부는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1899년 12월에 내무관리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하여 일본측과 제3국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단을 파견해서 일본인의 불법침입과 삼림 불법 벌채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후 울릉도·독도의 행정관제를 개정해서 격상시켜 울릉도·독도 행정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대한제국 내부는 울릉도에 가장 가까운 일본영사관으로서 부산 일본영사관의 책임자를 동행시키고 일본측에 교섭하였다. 그리하여 조사단은 대한제국 내부관리 禹用鼎을 책임자로 하고 한국측은 부산감리서(釜山監理署) 주사 김면수(金冕秀)와 봉판(封辦) 김성원(金聲遠), 일본측은 부산주재 일본영사관 부영사 赤塚正助와 경부 1명, 제3국인은 부산해관 세무사 영국인 라포르테(E. Rapor